청산가리, 산소의 가면을 쓴 암살자
- 편집팀
- 2022년 12월 21일
- 4분 분량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는 ‘독’
‘독’, 때론 우리와 너무 멀리 있기도 너무 가까이 있기도 하다. 모두들 싹튼 감자나 체리 씨에 독이 있기에 먹지 말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가끔씩 뉴스를 보거나 영화, 추리 소설을 볼 때도 ‘독’이라는 소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은 작은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이르게 하기에 오래전부터 살인 도구로써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독에 대한 관심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끊기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09년 순천의 한 마을 부녀자 4명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다가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치명상을 입었던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최근에 재조명되며 우리가 흔하게 들어왔던 ‘청산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청산가리는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인가?
청산가리란 무엇인가
청산가리, 이 녀석의 본모습은 바로 시안화물, 다른 말로 탄소 하나와 질소 하나가 하나의 단위인(-CN)로 결합해 형성한 분자들을 가리킨다. 청산(靑酸) 가리는 청색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문 표현인 Cyanide도 애초에 ‘어두운 파랑’을 뜻하는 그리스어 ‘kyanos’에서 유래했지만 모순적이게도 실제 청산가리는 무색을 띤다. 청산가리의 유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의 화학자 피에르 마케르가 청산(Prussic acid)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한 화합물이 프러시안 블루로 불리는 푸른색 염료이기에 이후 시안화물을 포함한 분자들에 청산가리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시안화물의 독성은 분자 내에서 나머지 부분과 시안화물 단위가 얼마나 쉽게 끊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시안화물일지라도 시안화수소(HCN)에서는 H와 CN의 결합이 잘 끊어져 강한 독성을 띄지만 시안화 메틸(CH3CN)은 메틸기와 시안물을 끊어내기가 매우 어려워 독성이 훨씬 약하다.
독성 시안화물의 종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청산가리는 살인 및 자살에 동원되는 시안화칼륨(Potassium Cyanide-KCN) 형태의 시안화염을 말한다. 이들은 이온화도가 높기에 물에 녹았을 때 완전히 용해되어 200mg~300mg만으로도 성인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맹독성을 띠는 특성이 있다. 또한 복숭아나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Amygdalin)이라는 화합물의 형태로 시안화물이 들어 있는데 이들은 소장에서 효소를 통해 쉽게 분해되어 시안화수소를 방출하는 맹독성 물질이다. 또한 우리가 먹는 ‘타피오카 펄’의 원료인 카사바 뿌리에서 추출되는 리나마린(Linamarin)과 로타스트랄린(Lotaustralin)도 아미그달린과 함께 ‘당과 결합하여 시안화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Cyanogenic glucosides’에 속하는 시안화물이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먹는 타피오카 펄은 카사바 뿌리를 곱게 갈아 물어 담근 다음 ‘루미나아제(Luminase)’라는 효소가 시안화물들을 HCN으로 바꾸어 증발시키기에 독성이 없는 것이다.
청산가리의 확산과 작용
청산가리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시안화염은 위산과 반응하여, Cyanogenic glucosides는 소화관에 존재하는 효소와 반응하여 HCN을 만들어낸다. 이때 생성된 시안화물은 산소보다 더 강하게 철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 헤모글로빈에 이미 결합해 있는 산소를 떼어내고 결합을 형성한다.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 곳곳에 산소 대신 시안화물을 전달해 주며 이들은 곧바로 최적의 장소인 세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 몸 전체에 확산된다. 세포 안으로 들어온 시안화물은 ‘시토크롬 C 산화 효소’와 상호 작용하며 죽음의 반응을 개시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의 마지막 전자 전달의 역할을 책임지는 ‘시토크롬 C 산화 효소’의 활성 부위에 (Fe3+)가 산소 대신 시안이온과 결합하면서 효소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정상적이라면 효소가 산소와 결합하여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ATP를 생성해야 하지만, 산소가 풍부해도 효소가 이미 시안이온과 결합하여 산소를 사용할 수 없는 조직 독성 저산소증에 걸리고 ATP 합성 경로를 방해하여 세포 호흡이 불가능하게 된다.

세포에서 산소를 사용한 전자전달계를 작동시킬 수 없으니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혐기성 대사를 시작하게 되고, 부산물로 미량의 ATP와 젖산을 생성하여 혈액의 pH 농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후 젖산 산증과 함께 근육 경련, 심박수 증가.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며 청산가리를 섭취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청산가리의 해독
그렇다면 어떻게 청산가리로부터 우리 몸을 살려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소개할 해독제는 바로 ‘아질산나트륨’이다. 이는 시안이온이 철 이온과 잘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해독 작용을 한다. 즉 헤모글로빈을 비슷한 다른 화합물인 메트헤모글로빈(Methaemoglobin)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일반적인 헤모글로빈은 Fe2+ 상태의 철 이온을 포함하여 산소를 운반할 수 있지만 메트헤모글로빈은 Fe3+ 상태의 철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산소를 운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메트헤모글로빈은 시토크롬 C 산화효소 대신 시안화물의 수용체가 되어 시안화물이 세포 호흡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해독 이후 ‘메틸렌 블루’를 이용하여 메트헤모글로빈을 헤모글로빈으로 되돌려 놓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행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독제로는 비타민 B12의 한 형태인 ‘히드록소코발라민’이 있다. 이 해독제는 메트헤모글로빈과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아질산나트륨과는 달리 소변을 통해 독성이 없는 시안화물 복합체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외에도 시안화물이 철뿐만 아니라 코발트와 결합을 형성하는 성질을 이용한 ‘디 코발트-EDTA’라는 해독제도 존재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청산가리 해독제는 시토크롬 C 산화효소 대신 시안화물이 결합할 수 있는 대체 공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로다네이즈(Rhodanase), 우리 몸속 천연 청산가리 해독제
앞서 말했듯 사과씨나 체리 씨처럼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변에서 청산가리나 시안화물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사과씨를 먹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해보진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소량의 청산가리를 먹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 ‘로다네이즈’라고 불리는 해독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로다네이즈는 티오황산염(S2O3-)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시안화물(-CN)을 티오시안산염(-SCN)으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로다네이즈는 티오황산염과 반응하여 공유 효소-황 중간체(Covalent enzyme – Sulfur intermediate)를 형성하고, 이 중간체가 시안화물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티오시안산염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우리 몸은 소량의 청산가리를 로다네이즈를 통해 해독할 수 있지만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해독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로다네이즈의 해독 시간이 매우 느려 갑작스러운 시안화물의 농도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티오황산염을 추가로 공급하거나 아질산아밀을 넣어 반응 속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아직 인증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해독법으로 알려져 있다.
홀로코스트, 청산가리의 아픈 역사
청산가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숨겨진 아픈 역사를 마주할 수 있다. 세계 2차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는 ‘치클론 B’라는 청산 가스 살충제를 이용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특히 아우슈비트, 마이다네크 수용소에서 사용되었는데, 그들은 흑사병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치클론 B를 대량으로 제조하여 뜨겁고 폐쇄된 가스실 안에 살포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치클론 B에 노출된 유대인들은 15분가량 고통과 아우성 속에서 참혹하게 죽어갔고, 그 참상이 가스실 벽면의 손톱자국들을 통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이는 나치의 대표적인 잔혹행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홀로코스트가 그 이전까지의 인류 역사상 전무했던 ‘산업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학살’로 규정되는데 일조했다.
정윤혁 학생기자 | Chemistry & Biology | 지식더하기
참고자료
[1] https://openlectures.naver.com
[2] https://www.hidoc.co.kr
[3] https://www.youtube.com/watch?v=c6i63BhBt5Q
[4] https://terms.naver.com
[5] https://www.e-gen.or.kr
[6] https://www.sciencedirect.com
[7] https://namu.wiki 캐스린 하쿠프, 『죽이는 화학-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과 14가지 독약 이야기』, 생각의 힘, 2016
첨부 이미지 출처
[1] https://www.acs.org
[2] https://nilacolori.com
[3] https://m.blog.naver.com
[4] https://www.wikidata.org
[5] https://terms.naver.com
[6] https://www.sciencedirec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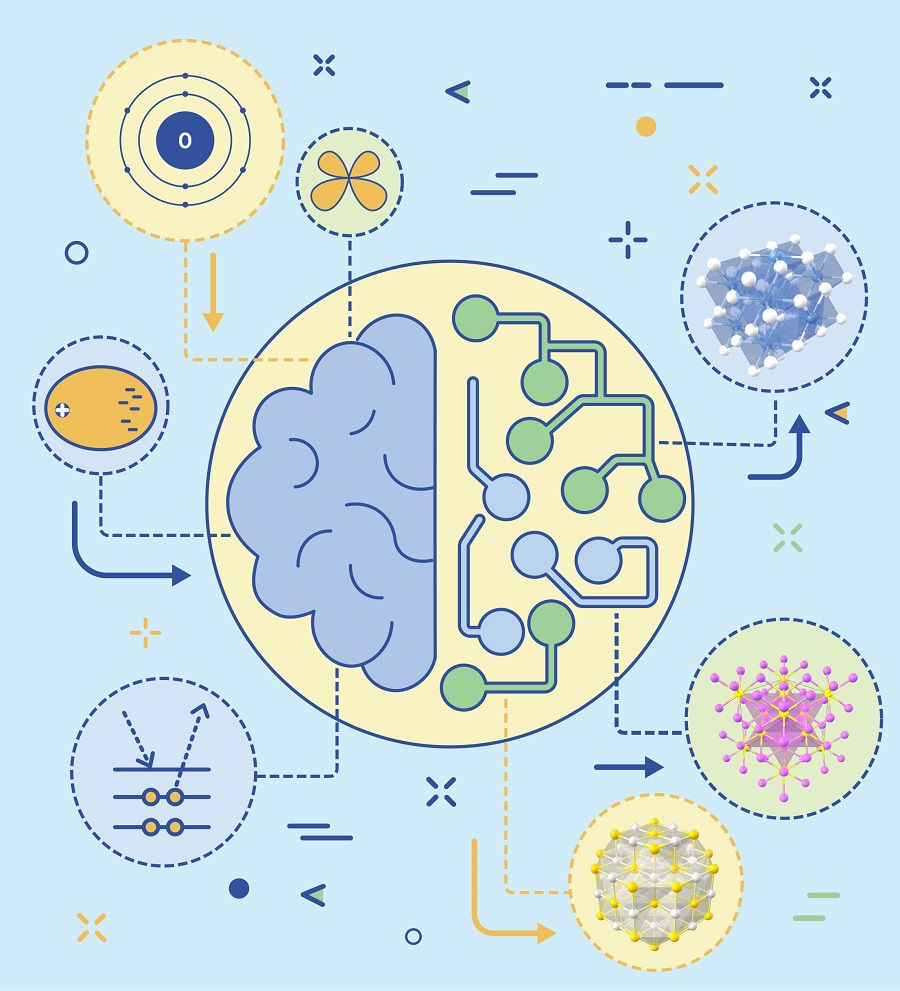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