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주식회사 : 'COVID-19'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 편집팀

- 2020년 4월 26일
- 27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10일
Introduction – 코로나 바이러스이(가) 중국에서 시작합니다
Coronavirus disease 19. 줄여서 COVID-19라 불리는 전염병에 전 세계는 혼란에 휩싸여 있다. 기사 작성 당일 현재, 이미 전 세계 203개국에서 93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5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바이러스는 잠잠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위의 사진은 영국의 게임 회사 Ndemic Creations에 만든 '전염병 주식회사 (Plague Inc.)의 실행 장면이다. 끝을 알 수 없이 커지는 바이러스 사태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용이 급증한 전염병 감염 시뮬레이터로, 바이러스의 전염을 넘어, 변이, 지역별 특이성,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재미있는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다. 몇몇 개인의 이기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 잘못된 문화가 만들어낸 급속한 확산, 방역을 포기한 채 사실을 은폐하는 몇몇 국가의 정책은 뛰어난 수준의 현대 의료를 믿고 있던 우리에게 회의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마스크, 전염병 격리 병상, 진단키트,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헐떡대는 여러 국가의 모습을 보면, 과거 전염병은 어떻게 진정되었는지, 배운 교훈은 없었는지 안타까움을 유발하고 있다. 이쯤 되면, 궁금증 하나가 슬금슬금 대뇌에서 기어 나온다.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사스, 신종 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까지. 수많은 전염병 사태가 있었어도, 왜 유독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거지? 과거에도 이 정도 되는 위기가 수차례 왔던 건가? 그때도 이런 식으로 대처했는데 잘 풀린 건가? 그때는 현재보다 의료가 더욱 열악하지 않았나?" 과거에 있었던 전염병 사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된 것일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전염병 사태 전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과 같이, 지금부터 우리는 과거의 팬데믹을 다시 보면서, 현재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이제, 함께 과거로 돌아가 보자. 형주에서 대역병이 발생했다! 팬데믹이 발생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이 2차 창작물로 사용된, 삼국지의 시대로 잠깐 들어가 보자.

모든 중국 역사를 통틀어, 한국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삼국지에서 3개의 중요한 전쟁을 꼽으라면 흔히 관도전, 적벽 전투, 이릉 전투를 뽑는다. 그 중, 한국의 판소리, 중국의 영화 등 여러 부분을 통해 가장 많은 2차 창작의 대상이 된 전투가 바로 적벽 전투이다. 조조, 손권, 유비 등 한이 무너진 이후,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는 세력의 가장 상징적인 전투로서, 제갈공명이 유비의 휘하에 들어온 뒤 준비하는 천하삼분지계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시기는 적벽대전. 바야흐로 천하가 분열된 이후, 가장 중요한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이다. 수군에 익숙치 않았던 조조군은 압도적인 중량의 함선과 쇠고리의 연결로 배를 육지와 같이 만든 뒤, 백만이라는 대군으로 공격을 시작한다. 10만의 손권과 유비의 전력이 조조에 비해 불리한 상황, 유비의 책사 제갈공명이 외친다. "화공을 전개하라!“ 그 말과 동시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남동풍을 따라 불화살이 날아가고 육중한 함선은 불에 휩싸인다. 그야말로, 극적인 역전승이 일어났다. (소설 삼국지연의의 일부를 각색) 그러나 이에 관해서 몇몇 역사책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 하북과 하남을 통일한 당대 중국의 최대 세력, 조조. 그러나 조조군의 진영에서는 곡소리와 파리 소리만이 가득했다. 습한 기후에서 생겨난 역병은,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적벽을 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에 조조의 군사 가후가 청을 한다. "형주의 습한 기후와 물이 많은 지역은 대군이 모이기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적은 강 건너 손권이나 유비가 아니라, 형주의 대역병입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천하 통일이 눈앞이지만, 조조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린다. "양자강의 배를 태우고, 허창으로 돌아간다.“ 그날, 적벽은 역병 환자의 시체와 조조 군의 군함이 타는 불길로 뒤덮였다. (삼국지 위서 무제기 / 오서 오주전 일부를 각색함) 당시 조조의 패배가 형주에서 돌고 있던 역병에 의해서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자, 이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미국인에게 들려주자. 그러면 한 가지, 난관을 겪을 수 있다. 대역병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분명 단순한 질병인 disease보다 큰 규모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팬데믹, pandemic을 쓸 수 있을까? "형주에서 팬데믹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우선 팬데믹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a disease that spreads over a whole country or the whole world / 전국 또는 세계 전역에 퍼진 질병’ 옥스퍼드 사전에서 팬데믹의 정의이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볼 때 이 정의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이 기사에서는 팬데믹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줄이고자 한다. 우선, 세계 보건 기구 (이하 WHO)의 기준을 살펴보자. 팬데믹을 구분하는 기준은 2009년 신종 플루 사태 등 세계 팬데믹 위기 대비를 위해 인플루엔자 대응 지침, 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등을 제정하며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Pandemic phase는 6단계로 구분되는데, phase 1~4까지는 팬데믹으로 구분하지 않고, phase 5~6에 이르러서야 팬데믹이라고 정의한다. 보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아래와 같다.

Phase 1 – 아직 바이러스의 사람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평시 상태. 특정 동물 내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 아직 팬데믹 가능성이 비확실한 단계다. Phase 2 – 야생 동물 또는 가축 등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이 됨을 확인한 상태. 잠재적인 팬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팬데믹 가능성이 비확실한 단계다. Phase 3 - 소규모 집단에서 감염이 확인되었으나, 아직 사람 간 전염은 확인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이 확인되는 상태. 아직 팬데믹 가능성이 비확실한 단계다. Phase 4 - 한 국가 내에서 지속적인 지역 내 확산이 확인된 상태. 팬데믹 가능성이 중간 이상인 단계다. Phase 5 - 하나의 WHO 지구에 속한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속적인 지역 내 확산이 확인된 상태. 팬데믹 가능성이 높거나 확실하다. Phase 6 - 다른 WHO 지구에 속한 1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속적인 지역 내 확산이 확인된 상태. 팬데믹이 진행 중이다. Post-peak period –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상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단계이나, 아직까지 강도 높은 대처가 필요한 단계. Possible new wave – post-peak period에 진입한 이후,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태. Post-peak period에서의 대처 실패나, 갑작스런 변이 등이 원인이다. Post-pandemic period – 질병의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떨어져, 풍토병 수준으로 제한되거나 아예 질병이 사라진 상태.

WHO는 위 사진과 같이 지구를 구분하였다. 각 지구는 반드시 의료 선진국과 의료 후진국이 적절히 섞여야 한다. 특정 지구에 지원이 가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다. 중앙아시아가 유럽 지구에,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가 아메리카 지구에, 함께 묶인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이 기사에서는 2005년 이후의 팬데믹은 팬데믹 선언 여부로 판단하였으며, WHO 설립 이전의 경우 위의 기준을 토대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감염자가 속출하는 문헌이 발견되었을 때를 팬데믹이라고 할 것이다. WHO 설립 이후이기는 하나, IHR 제정 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등의 경우, 팬데믹 선언 여부와 동시다발적 감염의 확인이 발견된 경우를 팬데믹으로 정의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삼국지의 일화를 영어로 번역하고자 한다면, 대역병에 팬데믹을 대응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굳이 disease를 쓰고 싶지 않다면 국지적인 전염병을 뜻하는 epidemic은 어떨까.
Jia xu, the strategist of Cao Cao said, "Jing Province is not appropriate for too many troops due to its humid climate. Our enemies are not Sun Quan and Liu Bei across the river, but an epidemic of Jing Province. You have to make a decision.
앞으로는 형주에서 팬데믹이 났다는 몰상식한 말은 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바이러스는 나누면 커지잖아요
'인류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진화했다.' 이 말은 아마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는 사람이면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 말은 진실일까? 우리는 아주 오래전, 인류는커녕 Hominidae도 존재하지 않던, 2500만 년 전으로 이동했다. 거기서 우연히 Hominidae의 공통조상을 만났다고 해보자. 비록 아직까지는 직립보행은커녕, 기억력조차 너무나 낮은 우리 조상님은 아주 부지런한 포유류다. "조상님, 건강하시죠?“ "ΣΕΩξκбЖЙжÅØffiéîさこヵǖō⺀бПцуфㄙㄟ┲ΘΞ! (그래, 적어도 코로나는 보이지 않는구나.)“ 당시는 여러 포유류가 에피데믹 수준의 바이러스를 갖기 힘들 정도의 작은 집단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을뿐더러, 현존하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아직 공통 조상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우리가 흔히 하는 인플루엔자, 코로나바이러스 등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상님은 현대의 우리조차 보지 못했던 레트로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RNA 자체가 직접 복제되는 다른 RNA 바이러스와 다르게, 역전사 과정으로 RNA에 상보적인 DNA를 다시 만든 뒤, 이를 다시 복제해 자기 증식을 한다. HIV 등 변이가 많은 바이러스들이 많이 여기에 속한다.)에 감염되었다. 무섭게도, 신경 관련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조상님을 치료하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치료는 실패했다. "조상님이 이대로 죽으면, 인류가 탄생하지 못 할텐데.“ 그리고 며칠 뒤, 참담한 마음으로 조상님의 장례를 치루고자 조상님의 집을 다시 찾았다.

조상님과 같이 다수의 포유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살아남아, 오히려 바이러스 유전물질을 이용하여 생존을 유리하게 하였다. 조금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이러스 유전물질을 이용했던 몇몇 개체만이 생존에 유리하여 살아남았다. 놀랍게도 조상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장기 기억이 형성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일까. 바로 조상님이 감염되었던 레트로바이러스가 포유류의 장기 기억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포유류의 장기 기억을 관장한다고 알려진 유전자는 Arc (Activity-regulated cytoskeleton-associated gene)이다. Arc는 장기 기억, LTP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포유류의 뇌에서 시냅스 가소성을 통제하며, 공간 지각, 공포 인지 등 다양한 영역에 관여한다. Arc 유전자가 Arc mRNA를 만들면 이는 액손 말단으로 이동해서 뉴런의 시그널을 기다린다. 시그널이 도달하게 되면, Arc mRNA는 전사되어 Arc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 Arc 단백질이 뉴런의 수용체 단백질 근처 막에 달라붙어 세포 내부로 막을 만들며 함입되게 하며, LTP가 감소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억이 조절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흔하게 알려졌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최근 2018년 독특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바로 Arc 단백질이 마치 바이러스의 캡시드처럼 Arc mRNA를 둘러싼 뒤, 세포막 밖으로 나간다. 이때, 마치 바이러스처럼 세포막으로 envelope를 만들어 캡시드와 같은 Arc 단백질 집단을 둘러싼다. 이렇게 만들어진 Arc 소낭은 뉴런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LTP를 변화시키고, 그 수는 증식된다. 이 과정은 HIV와 같은 레트로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사하다. 레트로바이러스가 세포 내부로 들어가 RNA를 복제한 뒤, 복제된 RNA를 캡시드로 둘러싸고 envelope 단백질을 만든는 것과 세부 반응마저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포유류의 장기 기억 조절은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에 따라 생겼다는 것이다. 나아가, Arc 유전자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Ty3/gypsy 레트로트랜스포손 (retrotransposon)은 Arc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레트로바이러스의 조상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외부의 레트로바이러스를 통해 현재 인간의 지놈을 구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DNA의 양은 무려 8%에 육박한다. 즉, 수많은 생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 과정 중에 자연 선택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현재 인간 사회의 구성은 물론, 인간의 존재조차 장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간은 바이러스와 경쟁을 하며, 현재의 인류로 진화했다. 그러면 이 조상님이 진화해서 탄생한 인간은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
라떼는 말이야, 팬데믹 따위는 없었다 이 말이지.
지금으로부터 1800만 년 전, 드디어 Hominidae가 포유류에서 분화되었고, Sahelanthropus, Australopithecus, Homo에 이르렀고, erectus, neanderthalensis, 지금으로부터 약 20만년 전, 현상 인류인 sapiens가 등장하기에 이른다. 특히 Homo sapiens는 도구 이용을 통해 더욱 빠른, 발전을 시작한다. 평등 사회라고 명명되던 구석기를 지나, 신석기에 도달하게 된다.
앞서 말했듯, 과거의 바이러스는 현재와 매우 다르다. 이는 바이러스의 빠른 변이로 인해 축적된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 중, 변이가 적은 DNA 바이러스 중 일부는 과거의 사람들이 걸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로 변이가 느린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당시의 사람에게서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그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1)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 Human papilomavirus) : 막이 없는 DNA 바이러스의 일종

대부분 성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 (STI) 신생아의 경우 극히 드문 확률로 수직 감염과, 호흡기 감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 접촉되는 경우 역시 종종 존재한다. 흔히 피부에 사마귀와 같은 유두종을 유발한다. 대부분이 질 내 성관계, 애널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이는 해당하는 바이러스 100 여종 중 40종 이상이 질 내 점막과 콘딜로마 (Condyloma)라고 하는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성인의 대부분이 한 번 이상은 감염되는 흔한 바이러스지만, 대다수가 자연 소멸하기에 큰 문제는 없다. (한국의 경우, 성인 여성에서 10명 중 1-2명, 남성에서 10명 중 1명 수치) 다만, HPV-16 등 몇몇 종류는 자궁 경부암을 유발할 수 있기에,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다.
개체군 유전학을 통해, 현재 HPV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은 인류의 극초기 단계라고 추측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특정 인종 그룹과 함께 진화하여, 인류의 이동과 함께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다. 특히 HPV-16은 Homo erectus와 Homo sapiens 모두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두 종의 차이를 서술할 때, 중요 사안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2) 헤르페스 바이러스 (HHV, Herpes virus) : Enveloped DNA 바이러스

1형~8형까지 나뉘는데, 가장 흔한 두 종류가 바로 HHV-1 (HSV-1)과 HHV-2 (HSV-2)이다. 둘 모두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통해 전염된다. 신생아한테 수직 감염 역시 흔하며, 키스, 식기 공유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인류의 68%가 현재 HSV-1의 보균자로 추정되며, 한국에서도 대다수 성인은 HSV-1을 겪은 적이 대다수다.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나가거나, 증상이 발현되어도 입가의 가벼운 뾰루지 정도로 지나간다. 가장 느리게 진화하는 DNA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특히, 지놈이 DNA 바이러스 중에서도 넓어 변이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야지 변화가 관찰된다. 초기에는 척추동물문을 따라 데본기에서부터 발전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특수한 점은 같은 척추동물 사이에서도 타입에 따라 특정 동물에게만 감염되는 성질이 나타났다. 이러한 숙주 특이성은 헤르페스의 전파 경로를 더욱 쉽게 예측하게 도와준다. 가장 많은 가설은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3) B형 간염 바이러스 (HBV, Hepatitis B virus) : Enveloped DNA 바이러스

HSV와 크게 유사한 특징을 가진 바이러스다. 주로 엄마와 신생아의 수직 감염이나 수평 감염으로부터 유래된다. 또한, 파상풍, 체액 노출, 성관계, 주사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염된다. 아동의 경우, 95% 이상이 만성 간염으로 이어지고, 어른의 경우 5% 정도가 만성 간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모의 감염 여부와 출산 환경의 위생이 아동의 보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증상이 나타난 경우, 피부와 눈이 누래지고, 어지러움, 복통 등을 호소한다. 바이러스학이 발달되던 시기에는 이미 사람 간 감염이 보편적이었지만, 오리 등 가금류와 다람쥐, 유인원 등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인수 공통 전염병에서 발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폐쇄된 아마존 부족에서도 endemic (고립된 지역에서 국지적인 확진자의 꾸준한 발생)의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이를 설명하는 주원인이다. 4) 인체 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HTLV, Human T-cell leukemia/lymphoma virus)

다양한 면역 세포 중에서도, T 세포, 그중에서도 CD4 양성 T 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바이러스다. 나아가, 레트로바이러스이기도 하여, 한때는 HIV와 구분하지 않았으나, 감염된 숙주 세포를 파괴하는 HIV와 달리, 천천히 정상 세포 기능을 변화시켜 암세포화시킨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보통 감염자의 2~5% 정도가 백혈병으로 발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발병하는 순간 1년 내에 모두 사망한다. 혈액 접촉이나, 성관계, 모유 수유 등을 통해 전염되나, 전염 가능성이 크게 낮다.
가장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여겨진다.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은 계절성 유행병이나 지형 및 기후적 특성에 따른 풍토병으로 발전하거나 세계 곳곳에서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시기에 감염자가 급증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유독 보균자가 높은 분포를 보이거나, 모든 사회에서 비슷한 보균자 비율을 가져야 하나, HTLV만큼은 특정 환경적 요인에 받는 영향이 적다. 카리브해 지역, 동아프리카 지역, 아메리카 고원 원주민, 일본 전역 등 높은 비율이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정의하기가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4가지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먼저, 치사율이 낮다. 전염성과 상관없이 보여주는 낮은 치사율은 당시 적은 공동체에서 바이러스가 꾸준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에 하나,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엄청난 치사율을 보인다면, 바이러스와 그 외 외부 요인으로 해당 공동체는 붕괴될 것이며, 숙주를 잃은 변종 바이러스 역시 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고대에 존재했던 바이러스가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건 낮은 치사율을 가진 바이러스만이 자연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STI, 성접촉을 통해 주로 전염된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반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신석기 시대의 난교 문화이다. 공동체 내, 부부 등의 개념이 없는 성생활은 STI 기반 바이러스 전염에 용이한 공간을 제공했다.
이러한 특징은 해당 바이러스들이 팬데믹으로 발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사회 구조 자체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바이러스는 팬데믹으로 이어지는 인플루엔자 등에 비해 전염이 쉽지가 않았고, 굉장히 낮은 치사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사항을 주의하자.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감염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감염 매개가 서로 연관이 없을 경우는 한 지역의 병이 여러 군데에 동시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

신석기 사회의 이동은 바이러스 및 질병 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농업을 위하여 강 근처에 정착하게 됨에 따라, 수성 전염병에 취약해졌고, 위생은 악화되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염 역시 더욱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인류사에 등장한 첫 바이러스들은 당시 사회 구조의 특성은 물론, 바이러스 자체의 특징도 팬데믹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또한, 해당 시기에 이루어진 수많은 바이러스와의 유전물질 교환은 현재 인간의 다양한 생명 활동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석기의 핵심 농업 혁명이 도래한다. 농업 혁명의 시작은 인간의 정착 생활에 따른 생활 오물 축적, 강가 근처의 생활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증가, 공동체 구성원 급증에 따른 다양한 전염 방식의 확산을 촉진한다. 결국, 우리 인류는 팬데믹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팬데믹 1 : 모든 팬데믹은 로마로 통한다

JustinianⅠ의 즉위 이후, 비잔틴 제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영토를 갖게 되었다.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집념이 강했던 그는 특히 이탈리아반도 수복에 집중했고, 동고트 제국을 멸망시키는 등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오랜 전쟁을 이탈리아 국토는 이미 황폐해져있었다. C.E. 476년, 서로마 제국은 완전히 멸망한다. 아직 동로마 제국이 남아 있었지만,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불리는 제국의 영역은 발칸 반도와 북아프리카, 중동에 한정되어, 과거 스페인, 프랑스, 영국은 물론 이탈리아반도마저 잃게 된다. 그렇게 로마의 영광도 완전히 저물어가는 듯싶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50여 년 뒤, 즉위한 JustinianⅠ은 과거 '팍스 로마나'의 영광을 되찾고자 했다. 공격적인 영토 확장으로, 이탈리아, 튀니지, 스페인 일부를 수복하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로마의 전성기가 시작되는가 싶었으나,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로마가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교통이었다. 포에니 전쟁 시기부터, 유럽 전역에 쌓아온 거대한 길은 행정과 군단의 이동, 상업을 용이하게 했으며 나중에 이르러서는 인도, 한나라, 당나라 등 중국의 왕조와의 교류도 가능케 했다. C.E. 541년, 우리 조상님의 후손, 알베르토 씨는 중동의 이민족과 교역을 하던 상인이다. 이번 원정에서는, 중동을 지나, 인도까지 간 적도 있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잘나가는 청년 사업가이다. 이러한 무역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쥐와 도적 떼이다. 상아나 종이와 같은 고가의 물건이건, 기름이나 곡식 같은 여행 필수품이건 상관없이 그들의 존재 자체는 상인에게 있어 최악이나 다름이 없다. 다행하게도 그는 별다른 문제 없이 알렉산드리아 근처, Pelusium에 있는 그의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사망한다. 그리고 며칠 뒤, 이집트 총독에게 정체불명의 죽음이 보고된다. 같은 시기 알베르토가 묶었던 유대의 교회에서도 비슷한 사망자가 속출한다. 그리고 며칠 뒤, 이는 이탈리아반도의 내정 안정에 힘쓰고 있던 JustinianⅠ에게 보고된다.
이것은(역병) Pelusium에 거주하던 이집트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금방 나누어져 하나는 알렉산드리아로, 다른 하나는 다른 이집트로 가고, 나머지는 이집트 국경 너머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이것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계속 퍼져나가며, 이것과 맞는 조건의 상황에서 더욱 심하게 퍼져나갔다. ...(중략)... 2번째 해의 봄 중반에 이르자, 이것은 드디어 내가 항상 머물던 비잔티움에 이르렀다. 이 초자연인 것은 이것을 보고, 만난 모든 사람을 공격했다. 처음에 이런 괴물을 만난 사람들은 성인의 이름을 빌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을 피난 오는, 대피처 성지에서도 사람들이 꾸준히 죽어갔다. 처음에는 이웃과 친구의 노크에 달려가서 도와주던 사람들도 노크가 들려오면, 마치 악마가 잡아간다는 듯, 겁에 질려 못 들은 척 외면하였다. 그러나, 그 어떠한 노력도 그 괴물을 막을 수 없었다. ...(중략)... 그들은(환자) 음식을 먹는 것조차 할 수가 없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죽어, 그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었고, 식량 또한 예년보다 극히 적어 굶주림에 죽거나, 그들 스스로 투신했다. 몇몇은 코마와 섬망의 증세를 더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온몸의 종기가 커져 그들 스스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죽기도 하였다. ... (후략) -Procopius, "History of the War"에서 부분 발췌
위는 당대 로마에서 가장 믿을만한 역사서를 작성한 Procopius가 겪은 내용을 축약한 내용이다.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았다. 단순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소빙하기가 다가오며 수복한 지 오래되지 않아 황폐했던 이탈리아 남부의 여름에 폭설이 내리고, 서리가 끼는 등 기존 유럽 곡창지대에서 작물 생산이 크게 줄었다. 이에 작물의 교가가 더욱 활발해졌는데 이것이 오히려 Rattus rattus의 이동 경로가 되어, 당대 지중해 사회 전체를 마비시킨다. 542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완전 종식이 된 이후에도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시 규모로 계속 발생하며 누적 2500만~1억 사이의 인구가 사라졌다. 콘스탄티노플에서의 종식도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한 뒤에나 정리되었다. JustinianⅠ마저 해당 질병에 걸렸으니 당대 사회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은 그 어떠한 치료법조차 남기지 못한 채, 환자들에 대한 선별적 격리와 생매장을 통해서야 겨우 정상화가 된다. 현대에 이르러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염병은 중국에서 기초하여, 인도를 지나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쩌면, 알베르토 씨가 병원소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유럽 역사에서 서술하는 3대 팬데믹의 가장 처음이다. 현대기준으로 볼 때도, 에피데믹이 아닌, 팬데믹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현 팔레스타인, 북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중동 지구,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을 포함하는 유럽 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역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병명 : 다음 단락에서 공개
별명 : Plague of Justinian
발생 연도 : C.E. 541
종료 연도 : C.E. 542 (콘스탄티노플에서의 완전 종식) / 산발적 감염은 C.E. 750까지 약 200년에 걸쳐 지속
감염 지역 : 중동 지구 (이집트, 리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 유럽 지구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루마니아, 헝가리 등)
추정 누적 사망자 : 2500만~1억 명
질병 전파 : Rattus rattus가 갖고 있던 병원균이 무역 도중 퍼진 것으로 추정.
특징 : (1) 당시 사회에서 다루던 질병과 달리, 코마, 섬망, 발진 등 종합적인 문제 발생
(2) 소빙하기, 오랜 영토 확장과 맞물려, 곡물 무역의 증가가 확산을 가속
질병 이후 변화 : (1) 비잔티움 제국 영향력 축소 (수복한 영토의 대부분 다시 잃음)
(2) 의학보다 종교적 가치에 집중하는 사회 지도층 증가
팬데믹 2 : Justinian의 저주? 검은 악마의 도래
위에서는 질병에 관한 참상에 조금 더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냉정하게 살펴볼까 한다. 왜냐면, 이번에도 1번째 팬데믹과 똑같은 병원균이 일으킨 질병이 똑같이 유럽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램 음성균의 일종인 Yersinia pestis에 의해서 발생하는 페스트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페스트 (Bubonic plague)가 발생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페스트는 감염 위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선페스트의 경우 림프절(lymph node)에서, 패혈성 페스트(septicemic plague)는 혈액 내에서, 폐페스트(pneumonic plague)는 폐에서 감염이 된다. 다행하게도, 선페스트인 상태에서는 전염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Yersinia pestis Bacilli라는 아종은 폐페스트로 발전하여 비말 감염을 일으킨다.

Yersinia pestis를 갖고 있는 벼룩이나 작은 동물에게 물렸다고 가정해보자. 세균은 림프관을 통해 림프절에 이르면 감염을 시작하여 림프절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임을 명심하자.), 이를 림프절 종대(buebos)라고 한다. 림프절은 일반적으로 직경 0.5cm의 작은 크기를 갖지만, 이로 인해 3cm 이상 커지게 된다. 이에 주로 목 주위, 겨드랑이 등이 부풀어 오른다. 이는 1~7일 정도는 약한 감기 기운, 두통, 구토 정도의 증세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악화되어 경련, 괴저, 극심한 고열, 호흡 곤란, 소화 장애, 섬망, 코마로 이어진다. 보통 사망자는 감염 10일 이후에 발생한다. 그나마도 선페스트는 이러한 증상이 둔화되어 나타나지만,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24시간 이내의 빠른 항생제 투여와 증상 완화 정도가 전부여서 24시간 이내 접종받지 않으면 현대도 치사율이 30~9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12시간을 지나 투여하는 경우에도 10%의 치사율을 보인다. 페니실린조차 없었던 당시에서 다수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들이 들어온 것일까? Justinian의 페스트가 재발한 것일까? 일단 위에서도 언급했듯, 페스트는 중국에서 기원했다. 이가 비단길을 따라, 중앙아시아, 더 멀리 우크라이나까지 전파가 되었었다. 특히, 흑해의 거대 항구도시였던 카파에서 1년 전, 역병 환자가 보고 되었던 걸로 볼 때, 카파에서 이동한 무역 상인이, 이집트를 거쳐 메시나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1347년 10월 15일 메시나에 열두 척의 배가 들어왔다. 대다수 선원이 죽은 채로 이동한 것이다. 메시나 당국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추방을 명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전염 속도는 유독 빨랐다. 11월이 되기도 전에, 제노바에 상륙, 다음 해, 8월에 이르러서는 영국 등 유럽 전역으로 퍼진다. 스페인 아라곤의 여왕 Eleanor, Edward Ⅲ의 공주, Alfonso Ⅺ 등 유럽 왕가의 주요 인물도 사망했다. 이탈리아의 일부 도시에서는 90% 이상의 시민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으며, 상황은 계속 심각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정책이 크게 느린 경우가 많았고, 일부 제후들은 교회 권력의 말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격리 노선을 주창한다. 결국, 정작 이 팬데믹은 강력한 격리와 무분별한 감염자 생매장 등 비인권적 방역이 합쳐져서 막게 된다. 간혹 면역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아, 자연 선택되었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발견된다. 물론, 면역을 가진 사람도 존재했다. 다만, 극소수였던 유럽 전체 인구의 0.4%. 만약 자연 선택 혹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길 기다렸다면 그의 갑절은 죽었을 것이다.
페스트가 남긴 가장 큰 효과는 현대적인 약의 개념을 주입했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허브를 중심으로 한, 약초학이 발달했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진을 통해 당시의 지식인들은 화학물질의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했다. 뱀의 독, 종기의 제거, 종양 절제 등 다양한 치료 겸 실험 방식은 현대의 의료용 도구의 정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나아가, 당시까지 지지받던 휴머리즘이 버림받게 되는 핵심적 계기가 된다. 다만, 이 모든 효과는 감염자의 인간을 고려하지 않던 무분별한 임상실험이라는 최악의 과정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상기하자.
병명 : Black Plague (선페스트, Bubonic plague)
원인균 : Yersinia pestis
발생 연도 : C.E. 1347 / 이후 여러 차례 재발. 대개, 1738년 동유럽에서 발생한 사건까지를 포함
종료 연도 : 특정 지을 수 없음
감염 지역 : 중동 지구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 유럽 지구 (이탈리아, 터키, 독일,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등)
추정 누적 사망자 : 7500만~1억 명
질병 전파 : Rattus rattus 등 rodent에 기생하는 벼룩, Xenopsylla cheopis (공복 상태에서 6개월까지 생존이 가능하다.)가 인간이나 다른 가축으로 숙주를 변경하며 Yersinia pestis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
특징 : (1) 지역별 정책에 따라 사망자가 크게 차이가 남
(2) 중세 교회의 잘못된 정책으로 오히려 전염률이 늘어남
질병 이후 변화 : (1) 일부 실용주의적 지도층이 기독교적 의료 가치관을 거부함
(2) 휴머리즘이 버림받고, 본격적인 의학 연구가 시작됨
(3) 허브를 중심으로 한 약초학이 사라지고 현대적인 약의 개념이 자리잡음
(4) 많은 농노들의 사망으로, 노동력 중요성이 증가하며, 농노제의 붕괴가 시작
팬데믹 3 – 내래 동무, 전염병이라 했어? 총살이라우!
세르비아의 민족 주의자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에게 폭탄을 던진다. 그리고, 이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5년조차 안 되는 시간에 무려 2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사망한다. 특히, 이번 전쟁의 다른 점은 지지부진한 전선 이동으로, 국민적 피로감이 심하고, 상황에 따라서 민간인 사망자가 엄청났다는 것이다. 언제 국민적 반발이 터져 외부와 내부의 혼란 속 항복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에는 '언론 통제'가 중요했다. 젊은이가 전쟁터로 자원하고, 중년층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부르주아가 앞다투어 채권을 사게 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는, 결국 엄청난 의료적 패배를 낳는다.
1918년 3월 11일, 전선의 고착이 장기화되가는 가운데, 미국의 캔자스 Fort Riely Camp에서 Gilbert Mitchell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병원을 찾는다. 그는 엄청나게 높은 고온을 보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비슷한 증세를 느끼는 병사들로 병원은 포화 상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제1차 확증기이다. 도대체 왜 이 병이 뜬금 없이 미국의 캔자스에서 발견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의 캔자스 자체가 감염원이 발생한 곳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왜 하필, 군 병원에서만 환자가 폭증했을까?' 의문을 피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중국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1918년 당시, 중국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영국과 미국에서 대규모로 배를 건조했는데, 그때 중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가벼운 감기가 돌았다. 인종 차별주의자에 의해 'Chinese laziness'라고 폄훼된 것이 바로 그 질병일 것이다라고 추측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굉장히 낮은 치사율을 보였고, 이는 이미 중국 사회에서 면역이 퍼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는 비슷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사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 다른 이는 프랑스라고도 주장한다. 1917년 프랑스 전선 야전 병원에서 대규모로 감기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스페인 독감의 모집단이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영국 등 다양한 가설이 있으나 아직 학계에서 정확하게 내린 결론은 없다.

당시는 분명 전염병 대유행이었으나, 승전한 군인을 맞이하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쏟아졌다. 정부 당국은 이를 제재해야 하지만, 전쟁에 대한 선동을 위하여 제대로 된 예방 대책,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렇듯 정확한 감염원을 알 수 없으니, 감염자 폭증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다행하게 1918년에 처음 발생한 집단 발병의 경우, 간단한 감기 유행 정도로 끝났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에 시작된다. 잠잠해지는 기미를 보였던 감염 곡선이 미국의 여러 주에서 동시에 증가했고, 미군이 이동한 프랑스, 영국, 심지어는 적국인 독일 등 거의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때가 전시 상태였던 만큼, 각국의 정부는 언론의 전염병 보도 대신, 전쟁 승전이나 미담을 보고하게 했다. 당시 중립국이였던 스페인만이 민주 정부의 아래에서 관련 소식을 쏟아냈고, 스페인 국왕 Alfonso XIII마저 확진을 받으며, 절대 감염원이 될 수 없던 스페인의 이름이 질병에 붙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2차 웨이브가 어느 정도 종료된 이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귀국하는 병사들로부터 다시 한번 3차 웨이브가 시작된다. 이때,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급속한 스페인 독감의 감소이다. 1919년 10월 16일 4597명에 달했던 필라델피아의 사망자가 11월 11에는 거의 사라진다. 이것이 가장 큰 의문점 하나인데, 몇몇은 이를 의사의 폐렴에 대한 이해도 증가에 의해서라고 평가했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과학적 원인은 없다. 흑사병을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질병이라고 불리는 만큼, 유독 많은 사망자를 냈는데, 최소 5000만~1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무려 1차 세계대전 사망자의 2배 이상. 괜히 20세기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다.
이 질병은 당시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사망자가 영아와 노인에 집중되는 다른 질병과 달리, 스페인 독감은 유독 20대, 30대 사망자가 높았다. 이는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다. 사이토카인 폭풍이 올아오면 복합적 면역 반응에 24시간 이내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코, 위, 창자에서 엄청난 양의 출혈과 점상 출혈이 동반되더니, 폐에 물이 차올라 익사하는 것이다. 청년 세대가 활성도가 높은 면역계를 갖고 있다. 당연히 대부분의 질병이 유입되었을 때, 적은 양도 찾아내고, 많은 양을 빠르게 제거하는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는 조금 달랐다. 사이토카인은 본래 다른 면역 세포들의 작용을 촉진하는 시그널의 역할을 하는데, 적은 양만으로도 활성화가 되어 엄청난 양의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특히, 최근 이 과정을 설명하는 여러 메커니즘이 제시되고 있다.

국내 여러 대학 연구팀이 모여 진행한 프로젝트로, 인터페론 β의 생성이 오히려 스페인 독감에서 감소함을 보였다. 이는 TBK1 등 핵심 인자를 스페인 독감 세포에서 반응에 이용할 수 없다. 이는 PB1-F2가 DDX3에 저해제로 작용하여 프로테아좀을 통해 PB1-F2가 분해된다. 즉 자연스럽게 인터페론 생성이 줄어들어, 바이러스 제거가 지연되고, 병인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독특한 특징이 바로 기존 조류나 돼지를 숙주로 삼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인간에 적응되고 인간 간 전염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다. 인간에게 감염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높은 전염성과 사망률을 목격하기까지 우리는 불과 2년도 걸리지 않았다. 도대체 왜 이러한 특징을 갖는지, 얼마나 빨리 변이를 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징이 일으킨 안타까운 점이 바로 잘못된 진단이었다. 많은 의사들이 콜레라. 뎅기열 등으로 착각하여, 방치한 점이 주변에 확산과 환자의 조기 사망을 촉진시켰다. 폐수종에 대처해야 할 적기를 놓친 것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1917년 평균 수명 51살은, 1918년 39살로 추락했다. 전세계 인구의 25% 이상이 감염되었고 2~3%에 가까운 인원이 사망했다. 독일령 사모아에서는 90%의 사람이 감염되었고, 22%의 성인 여성, 30%의 성인 남성, 10%의 아동 인구가 사라졌다. 브라질에서도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보였고, 아마존 오지 각지에서도 감염자가 발견되었다. 심지어 브라질 대통령마저 인플루엔자로 사망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곳이 있었다. 바로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몇몇 섬나라다. 피지의 몇몇 섬에서는 아예 감염자가 발견조차 되지 않았고, 일본이나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도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심지어 중국은 충칭 등 내륙에서는 환자가 거의 없었고, 항구도시인 상하이, 홍콩 등에서도 고작 0.25%, 0.32% 등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이에 관해 몇몇 학자들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치료가 오히려 사망의 주원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아스피린의 독성을 잘 모르던 당시의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복용시켜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가설이다.
결국 스페인 독감을 막은 건, 정부의 방역도, 기업의 백신도 아닌, 3번째 웨이브 뒤 정체불명의 이유로 급감한 뒤, 각 지역에서 계절성 유행병으로 토착화된 것이다. 결국, 제대로 되지 못한 이해는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인플루엔자에 의해 홍역을 치룬 WHO는 본격적으로 팬데믹을 준비한다.
병명 : Spansih Flu
원인 바이러스 : H1N1
발생 연도 : 1918.3 (첫 환자 발견) / 관련 사항 논쟁
종료 연도 : 1920.12
감염 지역 : 전세계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아메리카)
추정 누적 사망자 : 5000만~1억 명
R0 : 0.9 – 2.1명
질병 전파 : 조류의 H1N1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인간으로 감염된 뒤, 비말 감염과 애어로졸 감염으로 전염이 시작된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알 수 없다. 다만 동물성 기원은 확실하다. 문제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인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염률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상당히 높은 전염률을 보였다.
특징 : (1) 기존의 질병과 다른,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20, 30대 젊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음
(2) 전쟁으로 인한 언론 통제로 오히려 가장 잘 대처한 스페인의 이름이 붙게 됨
(3) 조류로부터 왔다고 추정될 뿐, 그 어떠한 감염 경로도 보고되고 있지 않음
(4) 앞으로 계속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팬데믹의 시발점
(5) 세계화로 인한 빠른 질병의 확산
질병 이후 변화 : (1) 사이토카인 폭풍 등 면역계에 대한 이해가 증가
(2) 인수공통 전염병 및 동물 유래 전염병에 대한 연구가 급증
(3) 국가 주도 방역 대책이 세계 단위의 논의로 확대됨
팬데믹 4 – 팬데믹, 이제는 제 밥입니다. -오대양 생존 전문가 WHO-
위에서 얘기했던 사망 규모와 감염원 등 부가적 내용 말고, 방역,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이 학문적인 이야기의 중심에는 WHO가 서있다.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1945년 UN이 설립된 이후, 1948년 4월 7일, 세계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UN 지속 가능한 발전 그룹에 WHO가 설립된다. 이후 각종 질병 퇴치, 공중 위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그 와중에 겪은 H2N2 기반 아시아 독감, H3N2 기반 홍콩 독감 등, 인플루엔자의 지속적인 변이로 다음 팬데믹 역시, 인플루엔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이 증가한다. 실제로 1997년 홍콩 독감과 아시아 독감의 시발점이었던 중국에서 다시 한 번 H5N1의 인간 감염이 확인되자, 1999년 WHO는 인플루엔자 팬데믹 대책을 선언한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무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에 걸쳐 엄청난 규모의 방역 대책이 시작되었다. 2005년 보건 관련 분야 최고 권위의 규율이기도 한, 세계 보건 협약, IHR이 의결되었다. (한국인이면 이 시점에서 조금 자랑스러워 해도 된다. 당시 WHO D.G. (Doctor General, WHO의 총 책임자)가 바로 이종욱 박사로 당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이겨내고, 당시 모든 소속 국가인 196개국의 동참을 이끄셨다. 이때 정립된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은 현재까지 WHO 방역의 가장 기본 매뉴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진행한 WHO의 인플루엔자 방역 정책은 크게 2가지의 목적을 지닌다. '빠르고, 지속가능하며, 단계별로 추진 가능한 정책'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의학적 대책'이다. 2007년 11월 27일에서 29일 인플루엔자 팬데믹 대책 본부가 결성되고, 같은해 12월 10일에서 12일, 팬데믹 인플루엔자 감시가 시작된다. 13일에서 14일, RA (지역 기구별 수장)와 워크샵을 갖는다. 2008년에도 꾸준히 만남을 계속 갖으며 2009년 4월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and Response>라는 지침서를 제작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같은 달, 드디어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시작된다. 자세한 방역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 우선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Orthomyxoviridae라고 하는 RNA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Core protein에 따라 Influenza virus A, B, C, D, Isavirus, Thogotovirus, Quaranja virus라는 7개의 genus로 구분한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H1N1 등의 팬데믹 플루는 Influenza A에 속해있다. 여기서도 Influenza A는 neuraminidase의 종류와 hemagglutin이라는 당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18종류의 hemagglutinin과 11종류의 neuraminidase에 따라 1번 Neuraminidase와 1번 hemagglutinin이 확인될 경우, H1N1이라는 식으로 명한다. 즉 이론적으로는 무려 198종의 Influenza A가 있을 수도 있다.
같은 서브타입에서도 변종이 심하게 발생하여, 흔히 분류는 바이러스 타입, 바이러스 추출 도시, 균주 번호, 추출 연도, 서브타입을 합쳐서 부른다. 예를 들어. 중국 남부에서 발원되어 서울에서 2015년에 추출한 H1N3는 A / Seoul / 04 / 15 (H1N3)라고 명명한다.

일반적으로 Influenza A는 감염된 포유류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애어로졸을 흡입함에 따라, 전파된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Hemagglutinin이 폐나 목의 상피세포의 시알산(silic acid)을 인식하여 내포 작용을 촉진시켜 세포 내로 흡수된다. 이렇게 생성된 endosome에서 hemagglutinin이 바이러스 envelope와 세포막을 결합시켜, 바이러스 RNA, vRNA가 단백질에 의해 압축된 상태로 분비된다. 분비된 vRNP(viral ribonucleoprotein)가 vRNA의 NPC(nuclear pore complex)에서의 능동 수송을 촉진시킨다. Ran-GTP가 Ran-GDP로 바뀌며 NPC가 캐리어 단백질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핵 내부에서 RNA를 흔히, negative-sense되었다고 한다. 이는 RNA-dependent RNA transcriptase 등과 반응하여 mRNA를 만든 뒤, 다시 번역시켜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RNA-dependent RNA polymerase와 반응하여 일시적으로 postivie-sense RNA가 된 뒤, 다음 바이러스의 유전물질로 준비를 하기도 한다. 이때, 번역된 바이러스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세포핵으로 다시 이동해서 RNA 복제를 돕기도 하고, 숙주 세포의 골지체로 이동하여 숙주 세포의 세포막으로 이동해 envelope를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바이러스가 세포 내부에서 복제된다.
바이러스가 증가하며 점차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보편적인 증상이 만성 피로, 콧물, 인후통, 기침, 오한, 몸살이다. 흔한 착각이 고열과 동반된다고 생각하여 열이 낮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고열은 모든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었다. 일부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고열만으로 병원을 찾거나, 고열이 없어서 일상을 지내던 시민들은 새로운 확산원이 되었다. 한창 인플루엔자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3월 멕시코 베라크루즈 La Gloria에서 호흡기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급증한다. 비슷한 시기 CDC 역시 여러 주에서 감기 환자의 증가가 보고된다. PA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범아메리카 보건 기구)에서 해당 환자의 샘플을 L.A. 연구소로 보낸다. 비슷한 시키 Oaxaca에 있는 병원에서도 SARS와 유사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보고된다. 4월 12일, 멕시코 NFP (National focal point, IHR에 의해 제정된 보건 당국)에서 베라크루즈 La Gloria에서의 대규모 환자 발생을 확인했고, 4월 14일 patient A라고 명명된 미국의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3월 말쯤에 남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에 살던 두 어린이에게서 발견된 호흡기 질환이 인플루엔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전염된 사실은 확정이 나자, 4월 18일 미국 CDC는 WHO에 '돼지 A형 독감 (swine influenza A H1N1)'을 WHO에 보고한다. 이때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WHO의 지휘 아래, 4월 23일 멕시코 NFP와 캐나다, 미국 CDC, PAHO까지 거대한 보건 당국들이 의심 환자 간 바이러스 비교를 하고, 동일한 변종 H1N1임을 확정 짓는다. 사람 간 감염 여건이 거의 확실시되자, WHO는 신속한 비상 사태 선언을 준비한다. 실제로 멕시코 당국의 전수 조사 결과 의심 사례만 천 건에, 의심 사망자만 59명이 발견되었다. 25일, WHO는 2005년 IHR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언한다. IHR에 정의된 바로 '세계 공중 보건을 무너뜨릴 국제적인 바이러스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 잠재적으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건 (an extraordinary event which is determined to constitute a public health risk to other States through the international spread of disease and to potentially require a coordinated international response)’ 이 일어난 것이다. COVID-19까지 포함하여 총 6차례 일어난 PHEIC 중 가장 첫 번째 사례였다. 전염은 그러나 계속되었다. 캐나다, 스페인, 이스라엘,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독일이 연속적으로 확진자를 보고했으며, 경계 역시 27일 phase 4에서 29일 phase 5로 상향한다. 그러나 계속 상황은 악화된다. 5월 2일 한국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 외 여러 지역에서도 계속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확산된다. 6월 11일, WHO는 phase 6로 상향을 하며, 팬데믹을 선언한다. 홍콩 독감 이후 사상 2번째 팬데믹 선언이자, 41년 만의 팬데믹 선언이다. 그후 잇따라, 백신 개발 소식이 각국에서 들려온다. 특히 9월 15일에는 4개의 회사, CSL Limited, MedImmune LLC, Novartis와 Sanofi Pasteur의 H1N1 백신이 FDA 승인을 얻는다. 그러나 계절성 특성 탓에, 쉽게 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초까지 계속된다. 결국 1년 이상이 넘은 2010년 8월 10일에 이르러서야 post-pandemic이 선언되며 계절성 유행병 전환으로 마무리된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긴 것은 분명하지만, 2009년의 인플루엔자는 분명 세계의 협력과 대응으로 성공적인 통제를 이룬 보건의 승리이기도 하다. 1999년 이후로 준비되던 대책은 미국, PAHO, WHO의 적절한 협력을 이끌어 빠른 대응 체계를 만들었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깊은 이해는 빠른 백신 개발을 성공시켰다. 나아가, 기존에 있던 여행 제한 등 쇄국적 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입국 제한 정책 자체에 2가지 한계가 있었다. 첫 주요 감염국이던 미국에 대한 쇄국이 불가능하다는 외교, 경제적 한계와 인플루엔자의 경우 과도한 입국 제한이 내부에서의 아웃브레이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모델링의 결과에 따른 학문적 한계였다. 여행 제한의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한 H1N1의 사례는 IHR의 '이동 제한은 필요가 없다.'라는 대목을 증명했다.)
병명 : 2009 swin influenza
원인 바이러스 : H1N1/09
발생 연도 : 2009.3 (첫 의심 환자 발견)
종료 연도 : 2010.8.10. - post-pandemic 선언
감염 지역 : 전세계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아메리카)
추정 누적 사망자 : 151,700~575,400명 (CDC 예측)
R0 : 1.4 – 1.75명
질병 전파 : 돼지의 H1N1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겨, 사람한테 감염된 것으로 추정. 이후 비말이나 애어로졸로 인한 빠른 감염
특징 : (1) 최초의 PHEIC 선언
(2) 역대 2번째 팬데믹 선언
(3) WHO와 각국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팬데믹 통제에 성공
(4) 이후에 일어날 EVD, MERS 등의 방역 지침의 교과서적인 역할
질병 이후 변화 : (1) 범지구적 방역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
(2) 쇄국적 정책이 아닌 협력적 방역이 주를 이루게 됨
에피데믹 – 간절히 바라도 우주는 도와주지 않는다
마지막은 팬데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 사회의 방역에 있어 하나의 큰 쟁점이 된 MERS는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흔히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이라고 알려진 병이다. 이의 조상인 베타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알려졌다. 실제 이집트 박쥐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지놈 염기 서열로 박쥐로부터 유래는 학계에서 사실로 굳어졌다. 흔히 한국 정부에서 낙타 고기와 낙타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해서 낙타에서 유래되었다고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낙타는 중간 매개체로 판단된다. 물론 중동의 MERS 유행 지역에 가게 되면, 낙타뿐만이 아니라, 낙타로부터 만든 음식, 박쥐 등 야생 동물 자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발견된 곳은 2012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로 SARS와 굉장히 유사한 증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증세가 기침, 고열 등 감기와 굉장히 유사하고 일부는 구토, 근육통 등을 보인다. 2012년 9월 기존 SARS와 다르다고 판단, WHO에 존재가 보고되었다. 감염은 낙타의 비말, 파스퇴르제이션을 하지 않은 낙타유, 완전히 익지 않은 낙타 고기, 낙타 소변 섭취로 인해 시작된다. 그 이후, 비말 감염을 통해 전염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한국의 몇몇 전문가들은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MERS에 대한 관심이 낮아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에서는 2015년 5월 20일 바레인 귀국 환자가 첫 확진을 받으면서 메르스 유입이 시작되었다. 다만, 공항 검역에서 확진을 받은 것이 아니라, 4일 입국 후, 11일 증상 발현, 12일 아산 서울의원 외래 진료, 15일~17일 평택 성모병원 입원, 같은 날, 365열린의원을 거쳐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 방문, 18일 삼성 서울병원 입원, 담당의 메르스 검사 보건 당국에 의뢰, 20일 확진이라는 어마어마한 병원 순례 문화로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해당 환자가 입원한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병원 응급실에 면역력이 낮은 환자들의 이용이 계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1번 환자에 의해, 평택 성모병원에서 감염된 14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을 무려 4일에 거쳐 방문하여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공포심 자극, SNS에서의 가짜뉴스가 퍼지는 등 최악의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정부 방역에 대한 신뢰는 급속도로 낮아졌다. 사실 MERS는 치사율이 높지만, 전염성이 극히 낮아 과거의 인플루엔자, SARS 등과는 차이가 크다.

그 결과, MERS 사태 때, 발생 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감염자가 발생한 곳이 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물론, 전염병을 숫자로 평가할 수 없지만, 비중동권에서는 유독 한국에서만 높은 감염률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병원 응급실을 순례하는 후진적 문화, 아픈 사람끼리 근접거리에서 모일 수 밖에 없는 응급실 구조, 민간 병원과 정부 당국의 소통 부재, 투명성과 신속성을 무시한 정보 은폐. 이 모든 것이 그러한 참상의 원인이다.
간절히 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우주는 도와주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그 결과 자체도 최대한 도와준 것일지도 모른다.
병명 :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원인 바이러스 : MERS-coronavirus
발생 연도 : 2012.6 (세계에서 첫 보고) / 2015.5.20 (한국에서 첫 보고)
종료 연도 : 2015.12.28. (한국 정부 종식 선언)
감염 지역 : 중동지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등), 한국 (지역사회 감염 기준)
추정 누적 사망자 : 약 1000명 / 39명 (한국 기준)
R0 : <1
질병 전파 : 박쥐로부터 유래된 베타코로나바이러스가 낙타를 중간 매개로 인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 이후 비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됨.
특징 : (1) 정부 당국의 정보 축소 공개, 후진적 병원 문화, 가짜 뉴스 등 한국 사회의 전반적 문제가 사태를 키움
(2) 비중동권에서 유독 높은 감염률을 보임
질병 이후 변화 : (1) 질병관리본부 지침 전면 개편
(2) 병원 내 응급실 문화 및 병문안 문화 등 개선
(3) 감염병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 =>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Closing – 코로나 : 사상 초유의 일상
위에서는 우리는 지질 시대부터 이어진 바이러스와 인간의 경쟁과 공존, 세계 역사의 유명한 팬데믹을 살펴보았다.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인구 밀도는 증가하였고, 교통은 증대되었다. 인류의 진화는 바이러스가 빨리 퍼져나갈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인간의 의료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독감 등 거대 팬데믹은 더욱 자주 일어난다.‘ 우리가 위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다. 로마의 길을 통해 Plague of Justinian이 퍼지고, 몇 년에 걸쳐 느리게 옮겨 가던 병원균들은 이제 단 몇 시간이면 국경과 바다를 넘어,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페인 독감과 차별을 이루는 인플루엔자의 대처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책, 협력과 연대의 방역’ 꾸준한 대비와 신속한 정보 공개, WHO 주도 하의 연대는 암울하게 보였던 인플루엔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하였다. 세계화됨에 따라,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에 대한 폐쇄가 질병 확산 통제에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세, 스페인 독감 때에 비해 발전했고, 협력과 연대는 세계화에서 질병 해결을 위한 기본 사항이다. 팬데믹은 한 지역이나 국가가 아닌,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COVID-19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세계를 외면하고, 국가의 한 부분을 무시하고 쇄국을 진행한다면 사태의 해결은 더욱 요망해질 것이다. -'사상 초유' 24시간 국회 폐쇄... '코로나' 방역 전쟁- -사상 초유의 올림픽 연기, 야구 대표팀은 어떻게 되나- -사상 초유 0%대 기준금리... 과거 위기와 성격 다르다- -'사상 초유' 코스피,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동시 발동... 과거 사례는?- -사상 초유 '재난지원금', 위기 극복의 '마중물' 되길- -사상 초유...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한 달 연기- -사상 초유의 4월 개학... 혼란 가중- -사상 초유 온라인 수업... 학교, 가정 모두 혼란- -사상 초유 '12월 수능'... 고3 수험생 부담 덜어낼까-

'사상 초유'의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의 시기를 살고 있다. 봄바람과 함께 시작되던 봄의 두근거림으로 가득하던 이맘때의 일상은 이미 사라졌고 사회적 거리 두기, 온라인 개학, 마스크 착용이라는 새로운 일상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채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부터 비롯된 스노우볼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삶을 위협받는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스트레스가 과중 되어서일까? 많은 사람은 폐쇄와 금지를 외치고는 한다. '전 국민을 위해서라도 대구를 봉쇄하자. 해외 입국자를 입국 금지시켜라. 왜 예배만 통제하고, 카페는 냅두느냐? 우리 쓸 키트도 부족한데, 왜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게 퍼주느냐.‘ 사태 초기 급증했던 대구의 감염자나, 배려심 없이 돌아다니는 몇몇 해외 입국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시한 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증가하는 확진자 추세를 보며 감정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우리는 중세와는 다른 시기를 살고 있다. 뉴스에 나오는 무개념들보다 더욱 많은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세계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 규약의 목적은 공중 보건 대응을 통해 국제적 질병 확산에서 건강 리스크와 이동, 교역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줄이는 차원에서 예방하고 컨트롤하는 것이다. The purpose and scope of these Regulations are to prevent, protect against, control and provide a public health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spread of disease in ways that are commensurate with and restricted to public health risks, and which avoid unnecessary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traffic and trad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이종욱 박사 휘하의 WHO 관계자들이 이 한 문장을 추가하기 위해, 며칠에 걸쳐 중국, 파키스탄 등지의 보건 당국 수장을 설득했다. 지금의 무능한 WHO는 차치해도, 왜 굳이 이 문장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공을 들였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과거의 전염병에서 무엇이 실패였고, 무엇이 성공이었는지, 알아야 한다. 코로나의 성공적인 조기 퇴치를 간절히 응원한다.
참고자료
[1] "The Neuronal Gene Arc Encodes a Repurposed Retrotransposon Gag Protein that Mediates Intercellular RNA Transfer", Elissa D. Pastuzyn and ten others, 2018 [2] "Viral Diseases and Human Evolution", Élcio de Souza Leal, and Paolo Marinho de Andrade Zanotto, 2000 [3] WHO, https://www.who.int/ [4] CDC, https://www.cdc.gov/ [5] "국가 혈액 관리 월보 2007년 11월호", 질병관리본부, 2007 [6] "Medieval Sourcebook : Procopius : The Plague", Fordgam University, https://sourcebooks.fordham.edu/ [7]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 WHO, 2011 [8] 질병관리본부, https://www.cdc.go.kr/cdc [9] "The Black Death : Europe in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ies", Utah university [10] "Black Death",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 [11] "Trafficking of viral genomic RNA into and out of the nucleus: influenza, Thogoto and Borna disease viruses", Jerome F. Cros and Peter Palese, 2003 [12] Nature, https://www.nature.com/ [13]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WHO, 2005
첨부 이미지 출처 [1] Plague Inc., Ndemic studio, 2020 [2] 삼국지 이미지, The Creative Assembly, 2019 [3] Pandemic phase, WHO, 2011 [4] WHO region, WHO, https://www.who.int/ [5] Pokemon, Game Freak, 2019 [6] Cervix and HPV, Verdict Medical Services, https://www.medicaldevice-network.com/ [7] HSV, Microbe online, https://microbeonline.com/ [8] HBV, VeryWellHealth, https://www.verywellhealth.com/ [9] HTLV, Arzeshinstitute, http://www.arzeshinstitute.ir/ [10] 신석기 시대, ZUM 학습백과, http://study.zum.com/ [11] Byzantine empire, Suscipe Domine, http://www.suscipedomine.com/ [12] WHO plague facts, WHO, https://www.who.int/ [13] "The origin and early spread of the Black Death in Italy : first evidence of plague victims from 14th-century Liguria", D. Censana, O.J. Benedictow, R. Bianucci, 2016 [14] Black Death, History Channel, https://www.history.com/ [15] Spanish flu in U.S., San Francisco Chronicle, https://www.sfchronicle.com/ [16] "‘20세기 최악의 세계 대유행’ 스페인 독감 왜 독종인지 밝혀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 [17] Pandemic Influenza, The New Zealand Journal of Medicine, https://www.nejm.org/ [18] Viral replication, NCBI, https://www.ncbi.nlm.nih.gov/genome/viruses/ [19] Outbreak comparison of coronavirus, SARS, swine flu, Community Finantial Service, https://communityfinancial.com.au/ [20] MERS outbreak in Korea, The Nature, https://www.nature.com/ [21] 기사 타이틀 모음, KBS 외 8개 언론사
첨부 동영상 링크
[1] "How Ancient Viruses Might Have Changed Our Brains", SciShow Psych, https://youtu.be/cXGw4sqbJKM [2] "The Plague of Justinian", The Pacifist, https://youtu.be/pJ35NulUNlY [3] "What Made The Black Death (The Plague) so Deadly?", The Inforgraphics Show, https://youtu.be/m5q-PIN3KSE [4] "Spanish Flu: a warning from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https://youtu.be/3x1aLAw_xkY [5] "Why Spanish Flu Killed Over 50 Million People - Deadliest Plague in Modern History", The Inforgraphics Show, https://youtu.be/tlM8pPotJQQ [6] “해피엔딩 사스, 헬피엔딩 메르스 뭐가 달랐던 걸까??", 비디오머그 https://youtu.be/04ycup_jBoo
KOSMOS BIOLOGY 지식더하기
작성자│이준하
발행호│2020년 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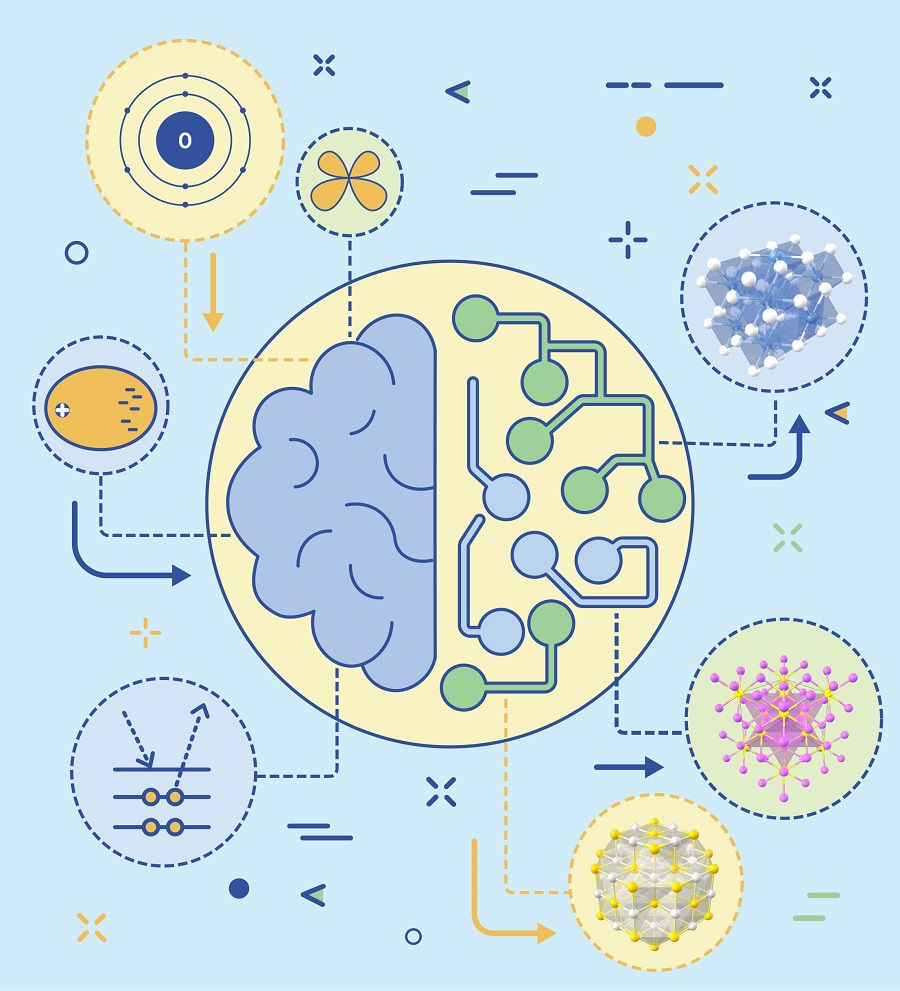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