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어리다고 안심하지 말아요, 예상치못한 사이토카인 폭풍
- 편집팀

- 2020년 4월 28일
- 10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10일
Introduction
최근 COVID-19가 유행하여 세계 각국에서 2-30대의 젊은 나이의 사람들 또한 잇따라 사망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17세 사망자가 발생하여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고 비록 최종 음성 판정은 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젊어도 COVID-19로 사망할 수 도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다. 우리나라의 COVID-19로 인한 10대, 20대 사망자가 아직 없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좋아서 사망 위기의 중증 환자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언제든 젊은 사망자는 나올 수 있다. 즉, 젊다고 안심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젊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좋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쉽게 이겨내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히려 젊어서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생기면서 심하면 멀쩡하던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사이토카인은 간단히 말하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소식을 전하는 편지같은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로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준비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침입 등 여러 이유로 이런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세포가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한다.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은 주로 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침입에 의해 발생하지만 대구 17세 사망자가 COVID-19가 아니어도 일반 폐렴으로 인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있듯이 다른 원인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러한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 알아볼 것으로 면역체계,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 폭풍의 원인과 치료 등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COVID-19와 면역체계, 사이토카인에 관해서 현재 COVID-19와의 전쟁에서 환자들을 지켜내고 계신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민재 선생님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담아낼 것이다.
우리 몸의 수호자, 면역체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창궐하여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시기일수록 면역력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면역이란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일까. 면역이란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등 생물 내에서 이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을 통틀어 부르는 말/pathogen)로부터 생물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작이다. 면역에는 병원체(pathogen)의 침입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선천 면역(innate immunity)과 특정 항원에 대한 기억을 통해 항원에 대응하는 후천 면역(adaptive immunity)이 있다.
선천 면역에는 먼저 외부 항원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피부 등 상피조직(epithelial tissue) 등의 물리학적 방어벽과 점액, 눈물 등 분비물을 통해 항원의 기능을 저해하는 생리학적 방어벽이 있다. 그리고 세포가 병원체를 먹어 없애는 식세포 작용(phagocytosis)과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염증 반응(Inflammation)도 선천 면역 반응이다.
면역 반응에 대해 잘 알려면 백혈구(leukocyte)에 대해 알아야 한다. 백혈구는 과립성 백혈구와 림프구 그리고 단핵구로 나뉜다. 과립성 백혈구는 과립이라 불리는 작은 알갱이를 포함하고 있는 백혈구로 염증 반응에 관여하며 호산구(eosinocyte), 호중구(neutrocyte), 호염기구(basophil)로 분류된다. 림프구는 기능에 따라 B세포, T세포, 자연 살해 세포라 불리는 NK 세포로 구분된다. 단핵구는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와 대식세포(Macrophage)로 분화될 수 있다.

이중에서 식세포 작용을 하는 백혈구들에는 호중구(neutrocyte), 대식세포(Macrophage),수지상세포(Dendritic cell) 등이 있으며 이들을 포식세포(phagocyte)이라 부른다. 호중구는 우리 몸의 백혈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양이 많으며 골수(marrow)에 있는 줄기세포에서 형성된다. 대식세포는 주로 몸의 한 부분에 머무르며 작용하지만 단핵구의 형태로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대식세포도 있다. 수지상세포는 식세포 작용을 통해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얻어 후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에게 전달한다. 또한 NK세포는 역시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데 식세포 작용과는 달리 세포 외부로 화학 물질을 방출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공격한다.

염증 반응은 유해한 물질에 대해 우리 몸을 보호하며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파괴된 조직을 제거하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일어난다. 병원체에 의해 손상된 세포가 호염기구나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마스트 세포(mast cell)를 자극해서 히스타민(histamine)을 분비하게 한다. 이 히스타민은 주변 모세혈관이 확장시켜 상처가 난 부위의 혈류량을 늘리면서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여 물질이 잘 지나다니게 한다. 상처 부위를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고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도 이 히스타민의 역할이다.

이제 후천 면역에 대해 알아보자. 후천 면역이란 특정한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을 겪은 후 기억을 생성하고 이 기억을 바탕으로 그 병원체가 다시 몸에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면역이다. 후천 면역에는 B세포와 T세포가 관여한다. 이런 B세포와 T세포는 모두 림프구로 둘다 골수의 조혈모세포에서 분화된다. 이후 B세포는 골수에서, T세포는 가슴샘(thymus)에서 성숙된다.
B세포는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로 이 때 항체는 항원(antigen-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생명체 내에서 이물질로 인식되는 물질)과 결합하여 항원을 제거하는 물질이다. 또한 T세포에는 보조 T세포(helper T cell), 세포 독성 T세포(cytotoxic T cell)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조 T세포는 선천성 면역세포에 의해 활성화되어 다른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세포 독성 T세포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여 병원체를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보조 T 세포를 Th, 세포 독성 T세포를 Tc로 줄여 표기하기도 하며 이때 Th1, Th2 와 같이 기호 옆에 숫자를 붙여 구체적인 T세포 종류를 나타낸다. 또한 다른 T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제어성 T 세포(regulatory T cell)는 Treg이라고 한다.

이 때 지금까지 나온 다양한 면역세포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체계화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면역세포 표면있는 분자들을 통해 면역세포를 분류하는 CD체계(cluster of differentiation)가 도입되었다. CD1, CD2 등 CD 뒤에 숫자를 써서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분자들을 나타내고, 각각의 면역세포가 어떤 CD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 면역세포를 구분한다. 보조 T세포에는 CD4가 있고 세포독성 T세포에는 CD8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이 세포들을 TCD4, TCD8이라 부르기도 한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표기이기 때문에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CD가 무슨 뜻인지 알아놓으면 영문 자료를 이해하는데 있어 좀 더 편리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포들 사이에서 서로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세포들은 자신이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까? 면역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화학 물질인 사이토카인 덕분이다.
사이토카인과 사이토카인 폭풍
그런데 어떻게 이 세포들 사이에서 서로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세포들은 자신이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까? 면역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화학 물질인 사이토카인 덕분이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이 사이토카인은 분비된 후 다른 세포 또는 분비한 세포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 이러한 사이토카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발견되고 있다. 사이토카인에는 크게 면역 세포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터루킨(interleukin),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만들어져 면역세포들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고 바이러스 작용을 방해하도록 하는 인터페론(interferon)이 있다. 그리고 골수의 줄기세포가 백혈구로 성장하도록 하는 콜로니자극인자(colony simulating factors), 열이 나게 하는 등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종양의 생성과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등 도 사이토카인의 종류이다.

먼저, 면역세포들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등의 작용을 하는 인터루킨(interleukin)은 IL로 표기하며 구체적인 기능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면 IL-1α, IL-1β 등을 포함하는 IL-1 인터루킨은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여 손상된 조직의 치유와 감염으로부터의 회복을 돕지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지나친 발열, 과도한 염증 반응과 폐 섬유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IL-1은 또한 여러 면역세포(T세포, B세포 등)를 활성화시키고 대식세포가 IL-1, 6, 8, TNF, GM-CSF 등의 다른 사이토카인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한다. IL-6 은 전반적인 후천 면역계의 세포들에게 영향을 주며 특히 B세포의 증식과 항체의 분비에 관여한다. IL-8은 호중구가 IL-8이 많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에 관여하는 인터페론은 병원체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역할을 하며 특히 제 1형 인터페론은 세포 사이의 감염성 물질의 확산을 제한하고 염증 전 반응과 다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며 후천성 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킨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 가을호의 ‘우리 몸의 면역과 인터페론’기사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또한 CSF라 불리는 콜로니자극인자(colony simulating factors)는 줄기세포를 백혈구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특히 GM-CSF는 호중구의 생성을 자극한다. 그런데 이 GM-CSF가 너무 많이 분비되면 그에 따라 지나치게 생성된 호중구가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상세포들까지 파괴될 수 있다. 게다가 호중구가 분비되는 효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조직이 손상되고 혈관이 막힐 수도 있다. 또한 TNF라 하는 종양괴사인자는 앞에서 종양의 생성과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TNF가 세포의 자살이나 괴사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TNF가 과도하게 작용하면 정상세포까지 파괴하여 조직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듯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사이토카인이지만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오히려 정상세포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많아진 사이토카인이 더 많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유도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은 더더욱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급성 폐질환, 호흡곤란 증후군,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이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의 대응
이제 독자들에게 COVID-19에 대한 우리 몸의 대응을 이야기하기 위한 배경지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이 COVID-19 바이러스가 우리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이러스는 다른 세균이나 기생충같은 병원체들은 그 자체로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반면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세포를 감염시키면서 전파한다는 것이다.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는 RNA 바이러스로 이 바이러스가 기관지나 폐포의 상피세포에 자신의 RNA를 밀어 넣는 것으로 침입이 시작된다. 그 후 감염된 세포는 여러 수용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가진 우리 몸과는 바이러스에 결합한 분자의 양식(PAMP,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을 감지하며 면역반응이 시작된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감지되면 제1형 인터페론 등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며 선천성 면역계를 작동시킨다.
그러면 호중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자연살해세포 등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게 된다. 대식세포는 식세포 작용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분해한 후 수용체를 통해 바이러스의 화학적 특성을 감지하여 TNF, IL-1,IL-8등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대식세포가 분비한 IL-8에 의해 호중구는 감염된 곳에 재빠르게 도달하여 식세포 작용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잡아먹는다. 또한 자연살해 세포는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자살 또는 괴사하도록 한다.


이 때 수지상세포는 이런 정보를 후천성 면역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수지상세포가 식세포작용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분해한 후 항원(antigen-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생명체 내에서 이물질로 인식되는 물질)으로 전환한 후 후천성 면역계의 보조 T 세포(helper T cell)에게 항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IL-12등의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아직 병원체를 접해보지 못한 미접촉 T세포(naive T cell)을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수지상세포는 바이러스의 화학적 특성을 인식해서 제1형 인터페론을 분비해 대식세포 등의 작용을 유도하기도 한다.
선천성 면역계에서 제시받은 항원에 의해 보조 T 세포는 활성화되어 세포독성 T세포(cytotoxic T cell)와 B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이 때 전문 자료를 보다 보면 MHC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것인데 MHC는 주요 조직적합성 복합체(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라 불리며 항원 조각과 결합해서 T세포 수용체로 하여금 항원을 인식하도록 하는 분자 형태이다. 즉, T세포는 항원 그 자체가 아니라 MHC 단백질에 결합된 항원 조각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후 보조 T세포에 의해 활성화된 B 세포는 항체를 생성하고 활성화된 세포독성 T 세포는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병원체를 공격한다. 이 때 각각의 B세포, T세포 중 일부는 기억 세포(Memory cell)로 분화하여 이후 계속 체내에 남아 같은 항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후 B세포가 만들어낸 항체를 통해 경증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에서 낫게 된다. 물론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염증 반응과 발열, 오한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경증이기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중증 환자의 경우 COVID-19의 작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COVID-19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가 T세포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으며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사망한 경우도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COVID-19로 인한 사이토카인 폭풍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다.
COVID-19와 사이토카인
아직까지 COVID-19로 인한 사이토카인 폭풍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이토카인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게 되고 사이토카인이 점점 더 많은 사이토카인이 생기도록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활성화된 면역 체계에 의해 우리 몸이 공격받아 제 기능을 잃게 된다.
최근 nature에 올라온 Xuetao Cao의 ‘COVID-19: immunopatholog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rapy’에 의하면 대부분의 중증 COVID-19환자들은 IL-2, IL-8, IL-17, G-CSF, GM-CSF, IP10, MCP1, MIP1α,TNF뿐만 아니라 염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IL-1β와 IL-6에 대해 높은 혈중 농도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폐렴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증상을 보였던 COVID-19의 환자의 경우 IL-6의 혈중 농도가 그 증상들의 지표가 될 만큼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한다.
IL-1β와 IL-6에 대해 알아보자면 IL-1β는 IL-6의 생성을 유도하며 IL-6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반적인 면역세포의 활성에 영향을 주고 특히 B세포의 활성과 항체 분비를 촉진한다. 구체적으로는 CD4+미접촉 T세포(naive T cell)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Th17(helper T cell의 일종) 또는 Treg(Regulatory T cell, 제어성 T 세포)로 분화시킨다. 또한 조혈줄기세포(Hematopoietic stem cell)이 여러 백혈구가 되도록 만들어주기도 한다. IL-6은 또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데 지나치게 분비되면 고열, 근육통 등 몸 전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폐렴 등 몸의 각 기관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IL-6은 염증성 질환 뿐만 아니라 림프계종양,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도 관계한다고 한다.
이러한 IL-6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로는 토실리주맙(tocilizumab)이 있다. 토실리주맙은 세포의 IL-6수용체에 결합하여 IL-6가 분비되더라도 다른 세포가 그 분비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능을 억제한다. 최근 COVID-19를 치료하는데 효과를 보여 유명해진 ‘악템라’라는 약품의 성분 또한 이런 토실리주맙이다. 이와 유사하게 IL-1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로 아나킨라(Anakinra)가 있다.


또한 란셋(lancet,의학분야의 연구를 전하는 저널)에 실린 ‘COVID-19: consider cytokine storm syndromes and immunosuppression’라는 글은 COVID-19 중증환자들에게 IL-2, IL-7, GCSF, TNF α등이 2차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sHLH-secondary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를 유발한다고 전했다. 이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단핵구와 대식세포의 지나친 증식으로 일어나며 발열, 혈구감소증, NK세포 활성도 저하 등이 있다. 혈구감소증은 면역세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서 자신의 몸의 다른 혈구를 공격하기에 일어난다.
여기서 IL-2는 CD4+ 미접촉 T세포를 Th1, Th2(helper T cell의 일종) 등으로 분화시키고 NK세포를 활성화시키며 특히 CD8+ 미접촉 T세포를 기억세포 또는 SLECs(short lived effector cell,직역하자면 짧게 사는 이펙터 세포)세포로 분화시킨다. 그리고 IL-7은 수지상세포, 상피세포, 뉴런(신경세포), 간질세포 등에 의해 분비되는데 이처럼 림프구가 아닌 세포에 의해 분비되는것이 특징이다. IL-7 역시 다양한 림프구들을 활성화시키는데에 관여한다. GCSF는 조혈줄기세포가 여러 백혈구가 되는데 관여하고 TNF α는 앞에서 본 것처럼 세포 자살이나 괴사를 유도한다. 이러한 TNF의 지나친 분비는 지나치게 많은 세포를 없애버려서 몸의 각 기관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듯 여러 사이토카인의 지나친 분비는 COVID-19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치료법은 없을까…?-감염내과 의료진과의 인터뷰
현재 COVID-19로 인한 사이토카인 폭풍에는 다양한 치료법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런 하나하나의 치료법이 기적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COVID-19의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의 회복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시행되는 COVID-19의 치료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그것을 완화시키는 대증치료 또는 다양한 항바이러스제를 섞어서 쓰는 칵테일 요법으로 이루어진다. 거기에 COVID-19완치자의 혈장을 주입해서 항체를 공급하는 혈장치료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COVID-19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특정한 항바이러스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치료하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사이토카인 폭풍이 면역체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생기기 때문에 면역체계의 작용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김민재 선생님은 ‘전통적으로 사이토카인 폭풍과 가장 관련이 높다고 생각되었던 질환은 패혈성 쇼크(septic shock)로 생각됩니다. 이 질환에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 지난 수십년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실제로 스테로이드 사용이 큰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COVID-19에서도 서로 상충적인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서 미생물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미생물에 대한 면역반응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에서 간세포를 파괴하는 것도 바이러스보다는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매개면역반응이고, 패혈성 쇼크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면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를 같이 사용해 보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실제로는 매우 국한된 감염병 (예: 결핵성 뇌수막염, 폐구균으로 인한 뇌수막염)에서만 그 효과가 증명되어 있습니다. COVID-19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모아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대답했다. 보통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과도한 면역반응을 억제하는데에는 스테로이드도 기능을 하였지만 COVID-19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는 뜻이다.
그리고 코미팜의 파나픽스라는 약물 또한 COVID-19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화제가 되었다.파나픽스는 IL-1β, IL-18을 비롯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 또는 방출을 감소시켜서 사이토카인 폭풍과 그로 인한 염증을 완화한다. 특히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하고 면역 반응의 일환으로 다른 세포들을 죽게 만드는 염증효소인 inflammasome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 또 투석처럼 혈액 속에서 사이토카인만 걸러내는 필터로 사이토카인을 제거하는 Cytosorb라는 치료법도 유럽 등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치료법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이토카인 폭풍 치료 방법에 대해 김민재 선생님은 ‘사이토카인 폭풍은 인간이 나타내는 많은 면역반응 중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인체의 현상들 – 급격한 혈압 감소와 장기 부전,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 등등-은 사이토카인 폭풍만으로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치료하는 기전의 약제나 치료제가 그것 만으로 기적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존재하는 현상과 병인이기 때문에 연구는 지속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Conclusion
이렇게 오늘은 면역체계와 사이토카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글을 마치면서 이 글을 읽은 독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요즘 COVID-19 사태로 인해 인터넷, 특히 블로그나 각종 SNS를 보다 보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적어놓은 글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글들을 쉽게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리게 된다. 나조차도 COVID-19사태 초반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COVID-19에 관련된 수많은 논문, 논문 초록, 과학 저널들을 읽어보니까 적지 않은 수의 SNS에 사람들이 ~~카더라 이런식으로 적어놓은 글들이 과학적 근거가 미비한 일명 ‘뇌피셜’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만 SNS를 보다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믿고 있는 것 같다. 몇 번의 구글을 통한 전문자료의 검색을 통해서 쉽게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인터넷의 블로그나 SNS등 개인의 의견을 적는 공간의 글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나서도 독자분들이 글이 무조건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네이쳐, 란셋, ncbi등의 연구 결과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은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독자들이 영어로 된 전문자료를 읽을 때 조금이나마 배경지식을 갖추고 거부감을 줄인 상태가 되는 것이었으니까.
또한 이 글을 읽은 독자분들은 SNS, 블로그, 뉴스 댓글 등에 글을 쓸 때 감정에 치우쳐 ‘뇌피셜’을 쏟아내기 앞서 한번만 본인의 글이 사실인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았으면 좋겠다.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쓴 글도 다른 사람에게는 COVID-19에 대해 지나친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아무리 현 정부에 대해서 본인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정부 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대책에는 잘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말처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보고 몇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합심해서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https://www.nature.com/
[2] https://www.thelancet.com/
[3] https://www.nature.com/
[4] http://www.mdtrinity.com/
[5 ]https://www.ibs.re.kr/
[6] https://www.cusabio.com/
첨부 이미지 출처
[1] https://www.creative-biolabs.com/
[2] https://courses.lumenlearning.com/
[3 ]https://en.wikipedia.org/
[4] https://en.wikipedia.org/
[5] https://www.ibs.re.kr/
[6] http://www.monews.co.kr/
[7] https://www.drugbank.ca/
[8] https://cytosorb-therapy.com/
KOSMOS BIOLOGY 지식더하기
작성자 | 김다연
발행호 | 2020년 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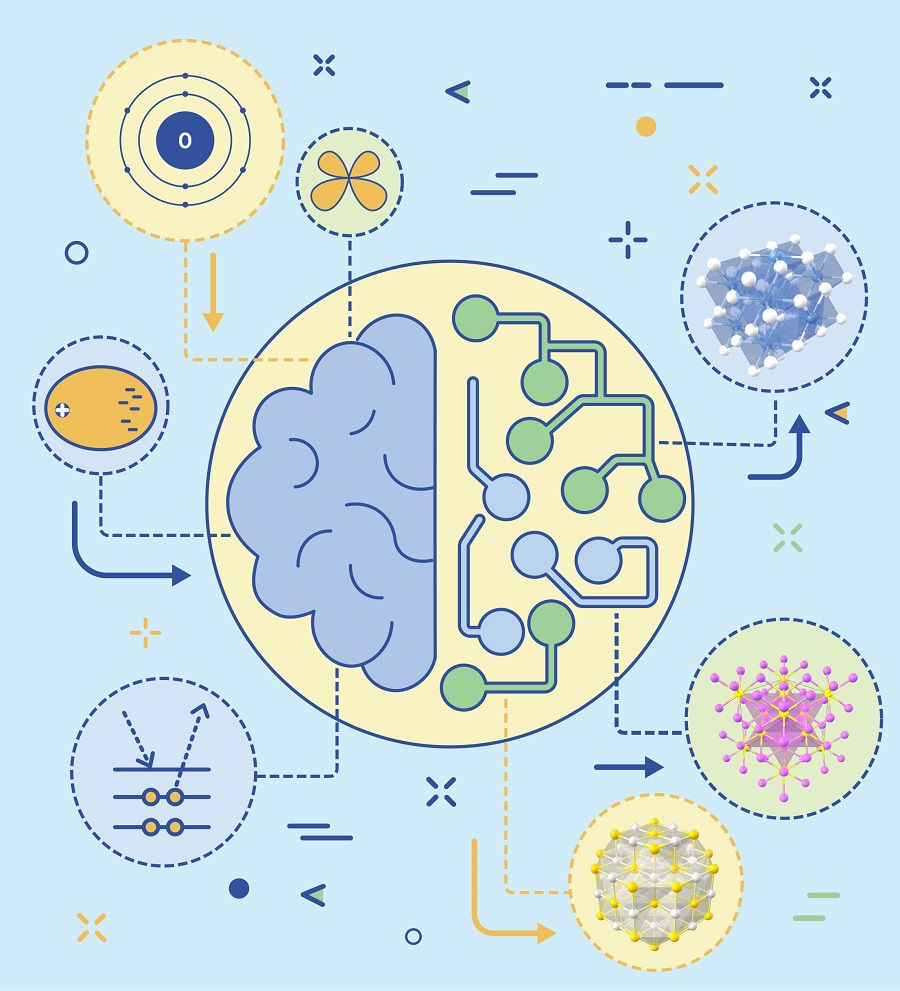
Comments